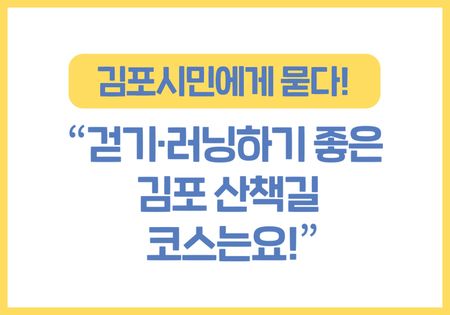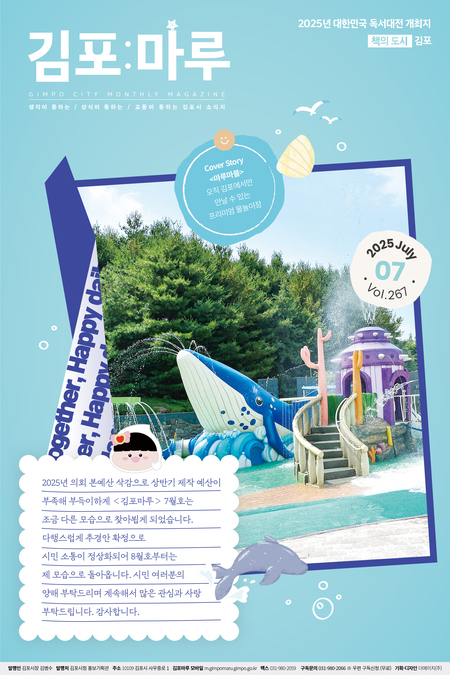|
세계가 인정한 우리만의 문화 김포장릉 글 양미희 시민기자
조선왕릉은 한 시대를 통치한 왕과 비의 영면을 모신 곳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특히, 김포시 풍무동(김포시 장릉로 79)에 위치한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그의 아내 인헌왕후를 모신 곳으로, 산중에 자리하고 있어 폐쇄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비로움을 확보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이곳이 수도권에서 유일하다고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김포장릉은 숲과 연지, 그리고 저수지를 품고 있어 그 수려함이 탁월한데, 이번 김포마루 ‘스토리of김포’에서는 김포장릉의 숲과 그 안의 공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가 우리의 문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김포장릉의 숲 이야기 오랜 세월 왕실의 엄격한 보호를 받은 김포장릉 숲은 자연림과 인공림이 어우러진 자연미가 오가 는 이의 발길을 더디게 한다. 특히 이곳은 소나무 숲을 빼놓을 수 없는데,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풍수 사상에 의해 명당자리에 심는 가장 중요한 수목으 로 소나무를 꼽았다고 하는데, 김포장릉 숲에 소나 무가 많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뭐니 뭐니 해도 김포장릉의 가장 큰 매력은 숲속 연지(蓮池)와 천연기념물 원앙이 서식하고 있는 저수지다. 연지는 연꽃을 심은 연못을 의미하는 데, 다른 왕릉에서는 흔하지 않아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특히 이맘때는 연꽃이 피기 시작해 김포연지를 방문하면 반드시 인증샷을 남겨놓는 게 좋다. 연꽃은 특성상 이른 아침에 꽃이 피고, 해가 중천이거나 빠지는 시간에 는 잎을 닫으니 인증샷 남김에 참고하길 바란다.
김포장릉 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의 서식지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곳이다. 원앙은 이곳을 남북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300여 마리가 오가며, 일부 원앙은 김포장릉 숲의 수려함 과 김포시민의 넉넉한 성품 덕에 이곳에 서식한다 는 보고도 있다.
김포장릉의 공간 이야기 김포는 예로부터 평야로 이름을 알렸다. 그만큼 산의 경사가 완만해 능이 자리하기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포장릉이 바라보는 곳에는 우리나라 젖줄인 ‘한강’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에 서 명당으로 꼽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 이러한 외적 입지조건으로 인조가 이곳을 부모 의 묘로 낙점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김포장릉 외부 공간이 이러할 진데, 내부는 또 어떨까? 능역 내 공간은 진입·제향·능침 등 3구역으로 나뉜 다. 우선 진입공간은 왕릉 초입부터 금천까지를 일 컫는데 능을 관리하는 인원이 상주하며 제향 준비 도 하던 재실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제향공간은 제향에 필요한 상을 비치한 정자각과 수복방, 능비 를 보호하는 비각 등이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능침공간은 정자각부터 봉분까지의 공간으로 이곳 은 왕을 보필하는 석상을 배치한 곳으로 석등(장명 등)과 석상(혼유석)도 이에 속한다, 이는 왕과 왕비 의 영면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했다.
또한, 봉분이 있는 성역 공간과 정자각 등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향 공간으로 나뉘는데 이 두 공간은 높낮이에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봉분이 있는 성역 공간에 서면 아래의 제향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는 반면, 아래쪽 정자각 부근에서는 부속 건물(정자각· 비각·수복방 등)과 우거진 숲으로 능침이 있는 성역 공간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는 성역 공간 은 능역에서 가장 상위개념이기에 폐쇄성을 높이 기 위함이다. 이러한 내적 공간의 미학으로 우리는 정자각 쪽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쪽을 바라보면 과 거 우리 왕조의 권위와 엄숙함이 절로 느끼게 된다. 신비감은 이곳 김포장릉 공간만의 덤이다.
김포장릉의 사람 이야기 왕실의 장례를 치르고 왕릉을 조영, 관리하는 일은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의 예법을 충실 히 따르며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으므 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졌다. 따라서 능의 입지 선 정, 조영된 능의 관리·감독 등 왕릉과 관련된 사항 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이 관여했다. 그중 인조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아버 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하고 종묘(宗廟)에 옮기 려고 하자 언관들이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당시 문 신이던 정온(鄭蘊,1569~1641)은 인조의 결정을 번 복시키기 위해 상소(『인조실록』 1634년)를 올리기도 했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