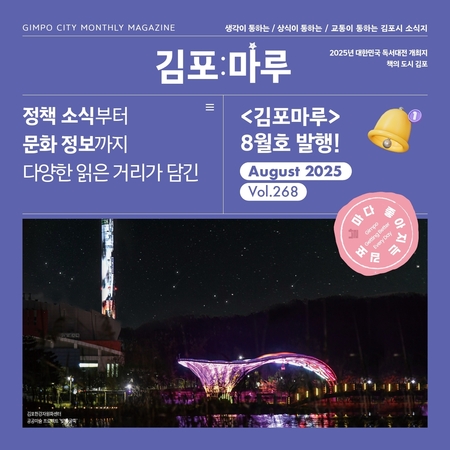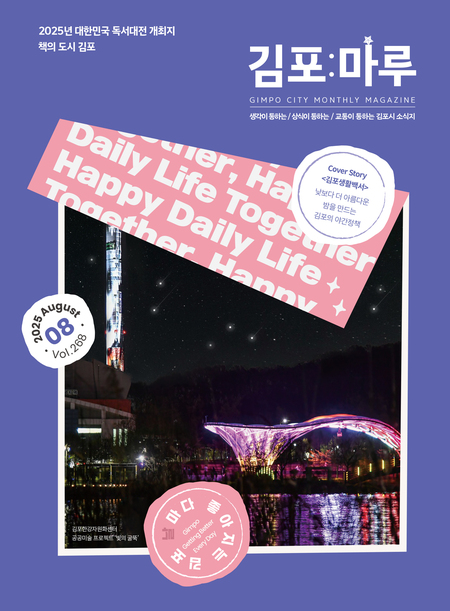|
1995년, 오래된 일이다. 당시는 광복 50주년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기념해 참으로 뜻깊은 일을 계획한다. 바로 우리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자 일제식 자연 지명 정비로 당시 전국에서 33개 경기도의 11개 시‧군에서 총 27개 지명이 정비 되었던 사실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을 조사해 정비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같은 해부터 지역 명칭 유래 등을 조사해 4곳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우리 김포라고 해 다를 바 없을 터. 아직도 제 이름을 찾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가 ‘염하강’으로만 알고 있는 ‘염하(鹽河)’에 대한 진실이다. 아니 아픔이다. 안타깝게도 염하는 일제강점기 그들에 의해 제멋대로 만들어낸 일본식 표기였기 때문이다.
염하는 한자 ‘소금 염(鹽)’에 ‘강 이름 하(河)’를 쓴다. 한자대로라면 ‘소금강’ 혹은 ‘짠 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러 역사서나 고지도를 살피면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흐르는 지금의 염하의 명칭은 찾아보기 힘들다.
염하는 분명 바다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과 같은 모양새와 조건으로 우리 옛 어르신들은 그냥 ‘강’이라 불렀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갑곶강(甲串江)이라는 표현이 이를 증명한다. 또 조선시대 『인조실록』 인조 15년 1637년 1월 22일에 이곳을 장강(長江)이라 기록도 있다.
반면, 연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통진부지도는 이곳을 갑곶대양(甲串大洋)으로 표기하였고, 조선시대 문헌 곳곳에서 갑곶진전양(甲串津前洋), 혹은 초지진전양(草芝鎭前洋)의 기록이 확인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1803년 화도수문 개축 후 세워진 강화도 대청교 근처에 있는 비석(화도수문개축비)과 1664년 수문을 처음 쌓았던 조복양의 기록 그리고 이은이 수문을 수리하고 지은 기문 등에서 선조들은 이곳을 바다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옛 기록과 지도와 문서 그리고 비석에 김포와 강화 사이의 물길은 강 또는 바다로 기록하고 나름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곳을 염하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해답은 역사가 가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조정은 포교활동 중이던 프랑스 주교 9명을 사형한다. 병인박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병인양요의 서막이 된다. 자국민이 처참하게 사형된 것을 안 프랑스는 그해 9월 18일 군함 3척을 띄운다.
이 군함은 서해안을 통해 한강까지 올라오고, 조선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 대적하지만 대포 등 당시 최신 무기를 사용하던 프랑스군에 한강은 물론 양화진 서강까지 내주게 된다. 이때 프랑스군은 조선의 수로를 측정하고 자연물을 관찰해 수집에 나선다. 그리고 해도를 완성한다.
당시 프랑스군이 작성한 해도에는 김포와 강화 사이 물길을 하천인 ‘Rivière’와 짠/염분이 있는 뜻을 지닌 ‘Salée’를 써 ‘Rivière Salée’로 기록한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짠 강’ 혹은 ‘소금 강’이다.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제국주의의 거만함이라고도 했다.
프랑스는 이 해도를 가지고 강화도를 침략해 만행을 자처하는데, 이때 프랑스가 약탈한 게 바로 외규장각이다. 이외에 은괘와 우리의 수많은 문화재가 그들 손아귀에 들어갔다.
1년 후, 일본 해군성은 프랑스에서 이 해도를 입수한다.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해 다시 펴내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이 지칭한 ‘Rivière Salée’를 일본식 이름인 염하(鹽河)로 직역하고 ‘고려서안 염하지도’라 제목도 붙인다.
이 과정이 우리가 염하를 염하로 부르게 된 까닭이다.
■ ‘염하(鹽河)’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양곡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이경수 선생은 2020년 발간한 그의 저서 『강화도, 근대를 품다(민속원)』 ‘제2장 서양의 첫 침략, 병인양요-염하와 강화해협’ 편에서 프랑스군이 이곳을 ‘짠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조선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 즉 제국주의의 거만함으로 보는 분석은 오해라 했다.
그 이유로 ‘Rivière Salée’는 프랑스군이 작명한 것이 아니라 강화주민의 말을 변역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처럼 폭이 좁아 비유적으로 쓴 것이라며, 프랑스 군이 조선에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Rivière Salée’까지 죄를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염하’가 일본인의 손을 타고 나왔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선생은 어차피 우리가 쓰는 현대 한자 용어들이 상당수가 일본에 번역되어 들어 온 것들이라며,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1938년 신문 기사를 예를 들었다. 이때 ‘염하’라는 명칭을 볼 수 있었고, 6‧25전쟁 이후부터는 여러 신문에서 찾아진다고 했다. 1961년에는 대규모 해병대 훈련이 이곳에 있었는데, 해병대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테고, 거기에 염하라고 표기했을 것이라 한다.
이후, 1967년 대규모 해병대 상륙 훈련이 있었고 서울에서 높은 사람이 많이 와 지켜보았다며, 그때 훈련 명칭을 ‘염하 작전’으로 정했고 신문은 그대로 보도됐다. 그러면서 ‘염하’가 ‘염하’가 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갑곶진전양(甲串津前洋), 초지진전양(草芝鎭前洋) 등 바다로 불리던 지금의 염하. 한자를 풀어보면 ‘갑곶(甲串)’과 ‘초지진(草芝鎭)’은 지명이고, ‘津(진)’은 ‘나루’를, ‘前(전)’은 ‘앞’을, ‘洋(양)’은 ‘바다’를 의미하니 ‘갑곶나루 앞 바다’나 ‘초지진 앞 바다’로 표기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 선조는 자신들이 살던 곳의 지명에 적절하게 환경을 덧붙여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셈이다. 그렇다고 21세기인 지금 고어를 그대로 빌려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염하를 다르게 부를 방법이 없을까?
염하는 김포와 강화 두 육지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다. 이러한 곳을 해협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수도(水道)·목(項)·도(濤:渡) 또는 샛바다라 불린다. 여기서 우리는 ‘샛바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수식과는 다르게 샛바다는 순우리말로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앞서 선조들이 고유 지명에 주위 환경을 어울려 새로운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김포(金浦)’라는 우리 지명에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 즉,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일컫는 ‘샛바다’를 어울리게 해 ‘김포 샛바다’ 혹은 ‘샛바다 김포’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물론, 근대 교육이 시작되고부터 이곳에 ‘김포강화해협’이나 ‘강화해협’이란 명칭이 붙어 있지만 말이다.
2024년 갑진년인 올해는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해다. 또한 일제강점기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잃어버린 우리 땅 이름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창지개명(創地改名)이라는 명목 아래 일제가 남긴 뼈아픈 역사를 되돌리고자 함일 것이다.
비단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나라를 움직여 일제가 남긴 지명을 몽땅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역사와 정체성을 찾아보는 건 과거 우리 선인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표현일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시민이 만드는 김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