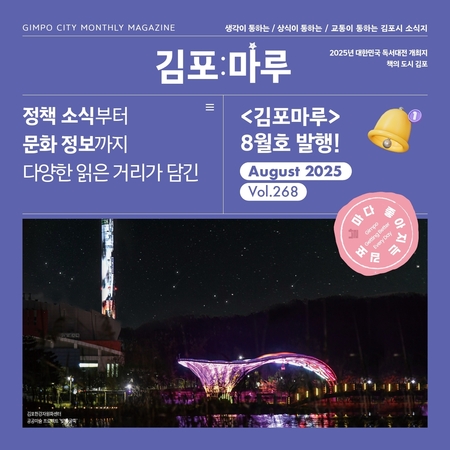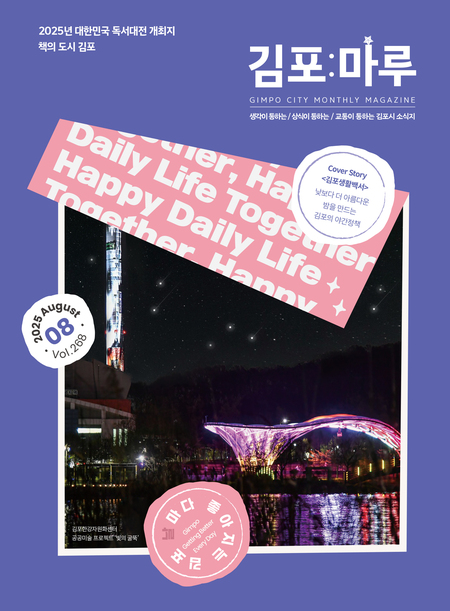시대를 넘고, 세월을 따라 흐르는 향기 산에 나는 문배나무 과실 향이 풍긴다는 데서 ‘문배주’라는 이름이 나왔다. 실제로 문배나무 과실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고려 시대 어느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비법으로 빚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진상했는데, 왕건이 매우 즐겨하며 높은 벼슬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일제강점기에는 평양 주암산 아래에 있던 평촌양조장이 문배주 제조로 유명했다. 평촌양조장은 ‘문배술’ 기능무형문화재 1대 보유자인 이경찬(1915~1993) 선생의 아버지 이병일 옹이 건립해 연생산량 3만석, 대지 7,000평, 건평 1,000평, 종업원 80여 명으로 성장했다. 1년치 세금이 평양시 1년 예산과 같았다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하겠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실향민이 된 이경찬 옹은 서울 하월곡동에 양조장을 설립하고 ‘거북선’이라는 이름으로 문배술을 다시 생산하며 가업을 이었다. 그러나 1965년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희석식 소주, 맥주, 막걸리를 제외하고 곡식으로 만드는 모든 술의 생산을 금지했고 이후 20여 년간 문배술은 생산이 중단됐다.
세대를 잇고,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술 오랜기간 생산이 중단되긴 했지만 술 빚는 기술은 대를 이어 전승됐다. 1982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전통주 제조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전국 방방곡곡 맛 좋기로 소문난 술과 솜씨가 모였다. 200여 종의 술이 몇 차례 거르고 걸러져 최종 심사대상에 46종이 선정됐다. 이를 다시 13종으로 압축하여 3년간 검증을 실시, 경합 끝에 1986년 문배술을 포함한 3종의 술이 문화재로 선정됐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획득한 이경찬 선생은 1987년 서울 연희동에서 다시 양조원을 열었다. 첫째 아들 이기춘 명인이 뒤를 이었다. 선대에 이어 무형문화재 2대 보유자인 이기춘(82) 씨는 1995년 전통식품명인(제7호)에 지정됐다. 1993년 마산동에서 양조원을 열며 김포와 인연을 맺었다. 1997년 현 부지인 이곳 서암리로 양조원을 옮겼다. 문배술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긴장감을 풀고 화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만찬주로 쓰였다. 이어 2018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평화 의미를 담아 건배하고 마신 술도 바로 문배술이다.
대를 이어 숙명처럼 전해 온 문배술 빚기 명인의 뒤를 이어 이승용(49) 대표가 술맛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과정의 도구나 기술은 현대화됐지만 발효, 증류와 같은 세밀한 부분은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다. 문배주를 빚기 위해서는 양조 용수와 밀, 좁쌀, 수수등이 필요한데 누룩은 밀 두 말에 물 다섯 되를 붓고 갈아 섭씨 25도의 실내에서 열흘 동안 발효시킨다. 이후 황색 곰팡이가 번식하면 좁쌀과 수수를 넣고 발효 숙성시켜 증류해 문배주를 얻는다. 약 6개월~1년 동안 숙성시킨 문배주는 엷은 황갈색을 띠고 향이 진하며 약 40도의 알코올 도수를 지닌다. 원래 문배주는 대동강변 주암산 물로 빚었는데, 우리나라에 흔한 화강암층 물이 아닌 석회암층 물로 빚어야 술의 향이 좋고 맛도 좋다. 석회암층의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서암리에서 문배주를 빚는 이유다. 문배주 양조원은 공장 주변 4천평 규모 부지에 지역 농가와 협업으로 찰수수와 메조를 재배하고 있다. 기본적인 재료 외에 전분이나 설탕 따위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문배주의 그윽하고 농밀한 향은 입 안 가득 긴 여운을 남긴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