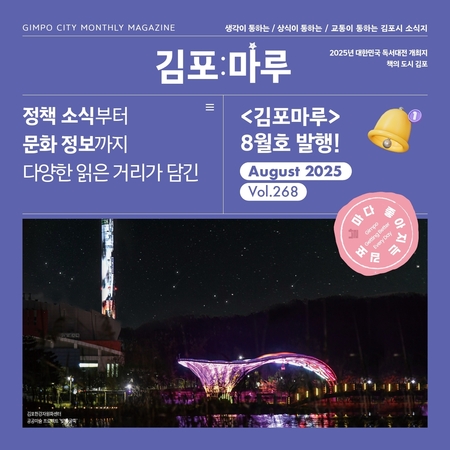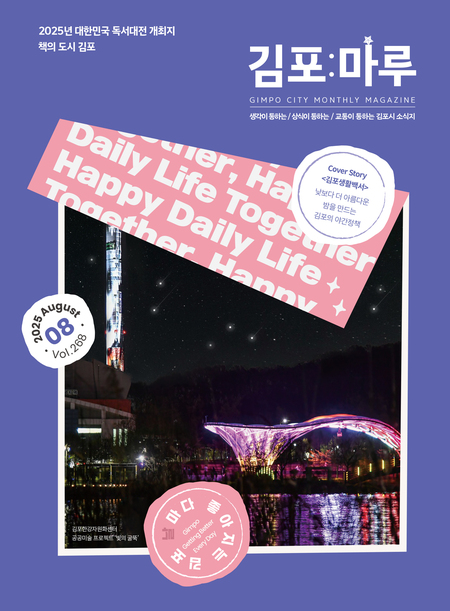겨울을 몰고 온 ‘손돌바람’ 절기상 소설(小雪, 11월 22일 또는 23일)을 지날 때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천기(天氣)가 올라가고 지기(地氣)가 내리며 하늘과 땅이막혀서 겨울이 된다. 이 무렵 농사일도 끝난다. 타작한 벼를 말려 곳간에 쌓아 두고 멍석에 무말랭이를 널거나 호박을 가늘고 길게 썰어 오가리를 만들기도 했다. 아이들은 처마 밑 에 줄줄이 매달린 곶감을 보며 입맛을 다셨다. 소설 무렵 강하고 매서운 바람이 일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김포에선 이때 부는 강한 바람을 ‘손돌바람’이라 불렀다. 순무김치와 쌀 ‘뻥이요’ 김포 사람들은 손돌바람이 느껴지면 서둘러 김장을 준비했다. 배추, 동치미, 총각김치도 담갔지만 하성, 월곶 등 북부지역에선 순무 김치를 담그기도 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김칫독은 특별한 음식 보관 시설이었다. 조금 넉넉한 집에선 돼지 다리를 통째로 넣어두고 숙성시킨 고기를 조금씩 떼어내 단백질을 보충 했다. 산림이 많은 지역에선 땅이 완전히 얼기전 알이 굵게 밴 칡뿌리를 캐러 다녔다. 눈이많이 오면 올무를 만들어 토끼가 지나는 길에 덫을 놓았다. 대명포구와 전류리포구에선 겨울에 망둥이와 숭어 새끼인 동하가 많이 잡혔는데 이를 구워 김치에 싸 먹거나 자작한 국물에 지저 먹었다. 평야지대인 김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을 이용한 음식이 흔했다. 얼리고 말리기를 반복할수록 더욱 단맛이 강해지는 무와 호박고지, 팥 등을 쌀가루와 함께 찐 시루떡을 자주 해먹었다. 쌀 부스러기인 싸라기와 엿기름으로 조청과 엿을 만들기도 했는데, 유과나 강정을 만들거나 가래떡에 찍어 먹었다. 대표적인 곡창지대다 보니 겨울철 뻥튀기 장수가 마을을 돌았다. 뻥튀기가 오면 집집마다 쌀, 보리, 콩, 수수 등을 들고 나왔고 동네아이들이 죄다 모여드니 이만한 행사가 없었다. 망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 때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뻥이요’ 소리에 왁자지껄 뛰쳐나갔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 겨울 농한기를 틈타 남자들은 주로 새끼를 꼬았다. 마당과 창고에 한가득 쌓여있는 볏짚은 꽤 쏠쏠한 부업거리를 제공했다. 새끼줄은 가마니나 초가지붕 이엉을 엮고 나무 동해를 막기 위한 보온재 등 쓰임새가 두루 많았다. 군고구마와 동치미 국물을 새참 삼아 늦은 밤까지 새끼줄 꼬기 작업을 이어갔다. 아낙네들은 바느질과 다듬이질로 남정네들과 삶의 호흡을 맞췄다. 산이 낮고 들판이 넓은 김포에선 싸리보다 수수, 밭에서 키운 답싸리가 흔했다. 말린 수수와 답싸리로 다음 한 해 동안 사용할 빗자루를 만드는 일도 겨울철 중요한 일거리였다. 사랑방에선 민화투나 엿방망이같은 투전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별다른 오락 문화가 없던 시절, 때로 농사지을 땅을 잃게 만들기도 한 위험한 어른들의 놀이였다. 빙하 같은 얼음이 한강에 떠다니면 아이들은 겁 없이 뛰어들었다. 두껍게 얼어붙은 유빙은 신기한 놀이기구였다. 껑충껑충 유빙을 갈아타다 보면 어느새 고양시가 눈앞이었다. 동네 양지바른 곳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모였다. 여자애들은 사방치기, 남자애들은 자치기로 떠들썩한 하루를 보냈다. 추우면 제방뚝으로 가, 지난 봄과 여름 소뜯기기 할 때 소가 싼굳은 똥에 불을 지펴 손을 녹였다. 수문이 닫힌 얼어붙은 강가에선 썰매를 타고 팽이를 치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벼이삭을 주워 짚불을 놓고 튀겨져 나오는 강냉이로 입술을 검게 물들였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