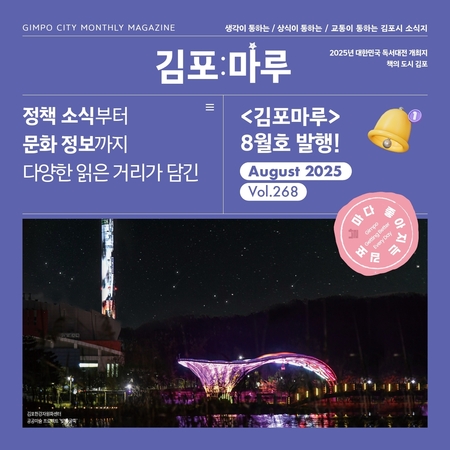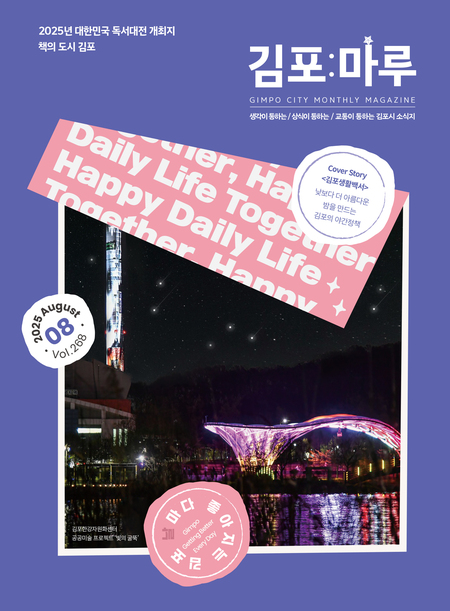|
잠룡에서 비룡으로, ‘용의 도시’ 김포 마을 곳곳 남아있는 용의 흔적과 전설
용(龍)은 고대부터 풍운(風雲)의 조화를 다스리는 물(水)의 신(神)으로 여겨졌다. 삼면이 강과 바다로 둘러싸이고 평야가 발달했던 김포에서 어업과 농업은 당연히 생업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농경을 보호하는 비의 신이자 풍파를 주재하는 용신(龍神)은 풍년(豊年)과 풍어(豊漁)를 기원하기 위한 숭배의 대상이었다. 정월 초이레부터 대보름까지 마을마다 농악놀이로 농사의 시작을 알렸는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새긴 농기(農旗)와 농악패 이름을 새긴 영기(令旗)의 앞으로 용을 형상화한 용기(龍旗)를 세웠다. 한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조강 어귀 마을에선 용왕제를 지내며 무사안녕과 복을 기원했다. 김포 물길이 이어지는 조강리에서 전류리까지 곳곳 지명에 용의 흔적이 남아 있고, 구전으로 내려온 김포의 설화에도 용이 등장한다. 글 황인문 시민기자
도움말 정현채 지역 연구가 도움글 「용궁부연록」(김포문화원 1993)
이무기가 살았던 ‘용연’과 용이 승천한 ‘조강’ 민통선 지역으로, 북한과 불과 1.2km 떨어진 용강리에 ‘매화미르마을’(월곶면용강로437번길 98)이란 곳이 있다. 멸종위기 깃대종인 ‘매화마름’과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 ‘미르’를 섞어 이름 지어졌다. 마을 가운데 연못이 있는데 ‘용연(龍淵)’이라 불린다. 500년을 산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한 못이다. 조선 영조37년(1760)에 간행된 「여지도서」 통진부지도에 기록된 용연은 아래로부터 물이 솟아 겨울에도 얼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일년 열두 달 마르지 않는 못의물을 길러 농사를 지었다. 연못 속 ‘숨구멍’에서 흡사 회오리바람처럼 솟아오르는 ‘용오름’을 승천하는 용의 모습으로 여겼다. 용연 주변에는 오리나무를 심었고 조선시대에는 통진현감이 기우제를 지냈다. 조강(祖江) 마을 사람들은 유도맞은편 어귀로 이어지는 길을 ‘용허리’로, 옛 강녕포 부근 돌출된 곳을 ‘용부리’라 불렀다. 유도는 용의 정점인 ‘여의주’라 해 용의 형상을 완성했다. 문수산 자락 흥룡골에는 흥룡(興龍)사와 용호(龍虎)사가 있었다. 조강은 조선 초기의 학자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기체 형식으로 쓴 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편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전류리 용의 전설과 용의 현신 ‘미륵부처’ 기운 좋은 서해 밀물은 조강을 지나 전류나루(전류리포구) 앞에서 강물을 태극으로 휘감으며 솟구친다. 그 힘으로 운양나루를 거쳐 서울 마포까지 치고 오르는데 용이 물속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용틀임을 연상할 정도의 위용이었다고한다. 강렬한 물살의 흐름을 따라 ‘물이 뒤집어진 마을’ 전류리(顚流里)라 했다. 전류리 봉성산 끝자락에는 용의 머리 형상을 닮았다 하여 ‘용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다. 용의 저주를 이겨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용바위 전설’의소재가 됐다. 운양나루는 김포 용화사(龍華寺, 운양동 831번지) 앞에 있던 나루다. 창건설화에 따르면 용화사는 강에서 건져 올린 미륵부처를 모시고 있다. 세상을 구원할 미륵부처는 용의 현신이다. 주역 건괘에서는 용(龍)을 잠룡(潛龍), 현룡(見龍), 약룡(躍龍), 비룡(飛龍), 항룡(亢龍) 등 성장 시기별로 나눠 설명한다. 잠룡은 때를 기다리며 내공을 다지는 시간이며, 현룡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때다. 약룡과비룡은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며, 항룡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마지막 단계다. ‘용의 고장’ 김포는 올해 인구 50만 시대를 열었다. 잠룡을 거쳐 현룡의 시기를 넘고 있다. ‘용의 기운’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꿈꾸는 도시 김포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