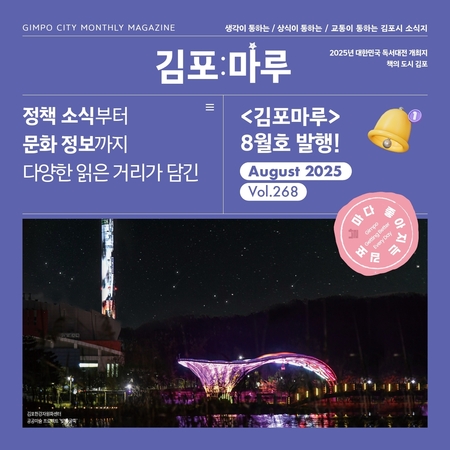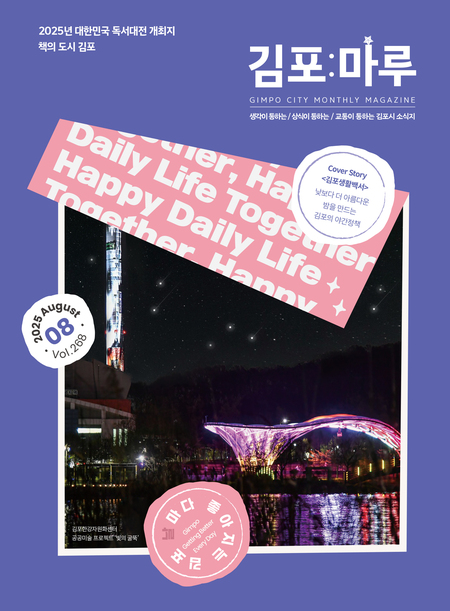#story1. 운을 기대하며 맞이한 새해 새해 첫날, 어르신들은 꼭두새벽 발 닿는 대로 걸으며 짐승의 울음소리에 귀를기울였다. 이른바 ‘청참(聽讖)’ 풍습으로 한 해 운수를 점치는 행위다. 까치소리를 들으면 손님이 오고, 돼지나 송아지 소리를 들으면 운이 좋고, 닭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많이 불어 좋지 않을 것으로 예감했다. 또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를 윷에 새겨 한꺼번에 던져 자빠지거나 엎어진 형태를 보고 운수의 길흉을 점쳤다. 특히김포는 동네마다 윷놀이가 성행했는데 승패를 통해 마을이나 집안의 운을 시험했다. 정월 초하루 차례를 지낸 후 세배나 성묘를 일찍 마치면 여자들은 널뛰기, 남자들은 돈치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투전, 장기, 바둑, 골패 등을 즐겼는데 윷놀이는 남녀가 공히 즐겼으며 대개 대보름까지 이어졌다. 대보름 후에도 윷을 놀면 보리가 죽는다고 하여 금했다. 정초실컷 놀았으니 농사가 시작되는 대보름 이후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였다 한다.
#story2. 차례상에 올리는 동어와 가세기 경상도 문어, 전라도 꼬막, 강원도 가자미, 제주 돔베 등 차례 상차림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 김포는 ‘동어’와 ‘가세기’를 올렸다. 동어와 가세기는 각각 숭어, 농어의 새끼다. 겨울에 한강에서 잡히는 숭어와 농어는 차례상에 올리기엔 씨알이 굵어 사용하지 않았다. 가을에 잡히는 동어와 가세기가 적당한 크기였다. 겨우내 딱딱하게 말린 놈들을 쪄서 실고추와잣, 지단을 얹어 상에 올렸다. 차례상에는 콩시루, 또는 기피시루 떡을올렸다. 떡 옆에는 작은 종자기에 조청을 담았는데 엿기름과 무, 생강,잣을 오랜 시간 은근히 가열해 만들었다. 물엿이나 설탕과 같은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은은하고 깊은 단맛에 감칠맛이 더해졌다.
#story3. 들판과 평야에서 건져 올린 음식문화 김포의 넓은 평야는 ‘오천년 쌀’로 대표되는 곡창지대를 형성했다. 철조망에 둘러싸이기 전, 강과 개펄은 평야 못지않게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한강변에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은 특별한 먹거리로 넘쳐났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을 때쯤 갈대 뿌리를 먹고사는 ‘갈게’를 잡았다. 갈게는 껍데기째 절구에 찧은 후 체에 걸러 액체로 만드는데 끓는 물에 넣으면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뭉쳐진다. 된장을 풀어 넣은물에 파와 마늘을 넣고 한소끔 끓여 낸 ‘갈게탕’은 특유의 향과 시원한 맛이 추위를 잊게 만든다. 집게다리 털이 특징인 참게도 예전 김포에선 흔한먹거리였다. 탕으로 끓이거나 게장을 담가 먹는데 꽃게와 비교하면 살은적지만 장맛이 더욱 깊고, 담백하며 감칠맛이 난다. 김포 사람들은 누산리, 봉성리에 드넓게 펼쳐진 개펄을 ‘돈판’, ‘돈벌’이라고 불렀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갈대와 참게, 갈게를 서울로 내다 팔았는데 꽤 짭잘한 돈벌이 수단이었던 것 같다.
#story4. 질경이, 소리쟁이, 모데, 미꾸라지 한강은 부지런한 사람에겐 인색하지 않았다. 이른 봄, 물이 들어왔다 앉은 자리엔 질경이가 자랐다. 여린 잎을 따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먹거나 나물처럼 무쳐먹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소리가 난다는 소리쟁이 풀은 빨갛게 올라오는 여린 줄기를 잘라 된장국으로 끓였는데 몸속 회충을 잡고, 염증에도 효험이 있었다. 수생식물로 습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올방개와 모데는 묵으로 만들어 먹었다. 모데로 만든 묵은 맑고 투명했고, 올방개묵은 이보다 약간 탁했다. 농사일이 바빠지면 아무래도 들판이나 벌판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수시로 김을 매야 풍성한 가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김을 매며 잡은 미꾸라지로 탕을 끓였는데 이만한 별미가 없었다. 미꾸라지는 흙내와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해금을 해주는데 김 포에선 소금대신 막걸리에 두어 번 빨았다. 무, 파, 마와 고추장으로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을 끓여 미꾸라지를 통으로 집어넣었다. 국수를 넣어 걸쭉해진 탕은 논 가운데서 즐기는 최고급 새참이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