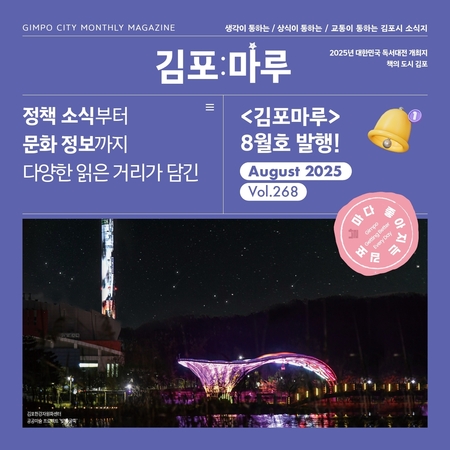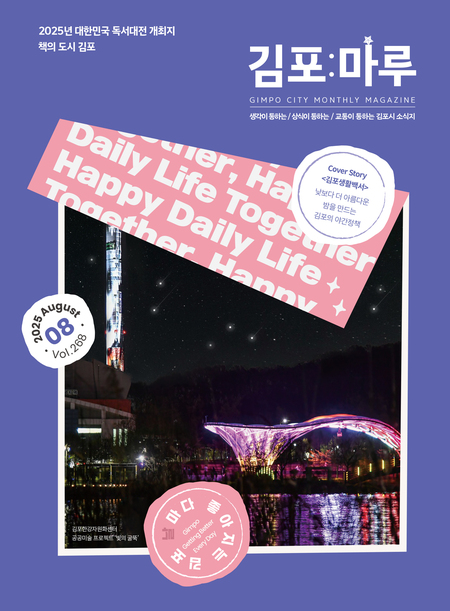|
광복 76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곳곳엔 아직도 일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난 95년 일제강점기 상징과도 같았던 조선총독부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지만 서대문형무소, 용산역, 군산 내항 등 여전히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다. 김포의 대표적인 일제 흔적으로 통진이청을 꼽을 수 있다. 때로는 잊고 싶기도 하고 분노하게도 되지만 아픈 역사도 역사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표정을 달리해 온 통진이청을 만나보자.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길잡이가 될지도 모른다. 글 황인문 시민기자 도움 향토사학자 유지만·정현채·김진수
조선시대 통진관아의 기능과 역할
통진이청(通津吏廳)은 월곶면에 있는 조선시대 건축물이다. 기사년(1869년)에 부사 백낙선이 중수했다. 201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66호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관아건축은 극히 일부만 현존하고 있다.
평택 팽성객사, 안성 안성객사, 양주 양주관아지 정도다. 통진이청은이곳들과 함께 경기도 관아건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사적이 다. 통진도호부 옛 관아도를 살펴보자. 일제강점기 변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림이 보여주는 옛 관아와 주변부에서 현존하는 건축물은 향교와 이청이다. 위쪽 내아는 관의 수장인 부사, 또는 현감이 거처하던 살림집이다. 현 월곶생활문화센터 자리다. 내아 아래 동헌은 고을 수령이 재판을 하거나 민원인을 접견하는 등 공식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다. 동헌 양옆으로 이청과 향청이 있는데, 이청은 이방에 속했던관아 아전들이 근무하던 관청이다. 향청은 지방의 수령을 자문, 보좌하던 자치기구로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쯤 됐던 곳이다. 객사는 관아에서 임금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건물로, 임금 행차 시 숙소로 사용됐다. 특별히 분진관(分津館)으로 명명됐다. 사창은 곡물창고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던 곳이다. 이밖에 향교는 교육기관, 형옥은 감옥이다. 양쪽 끝으로 여단과 사직단이 보인다. 사직단은 현 분진중학교 인근으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다. 종묘와 함께 국가의 근본을 상징한다. 여단은 고을 수령이 세상을 살다가 화를 당하고 떠난 원귀들을 달래기 위해 제를 지내던 장소다. 통진관아는 1만 7,845㎡ 규모로 당시 보기 드문 큰 관청이었다.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 멍에
도호부 관아는 구한말 병인양요 때 대거 파괴되었는데, 일제는 그나마남아있던 관아를 식민 지배의 도구로 이용했다. 조선총독부는 관아에총과 칼로 무장한 군인을 파견해 고을을 지휘했으며 통진이청을 경찰의 하위기관인 주재소로 사용했다. 주재소 소속 순사들은 주민들의 행동과 사상을 감시하고 조사했다. 특히 3.1운동 당시 헌병대를 보내 체포된 독립운동가를 대들보에 매달고 고춧물을 붓는 등 모진 고문을 가했다. 고통을 당한 독립운동가들은 김포경찰서 이첩 후 재판을 거쳐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다.
마을 주민들은 나라를 빼앗기기 전인 1908년 구국교육을 위한 신교육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분진학당을 설립했다. 객사였던 분진관과 향교의 명륜당에 교사를 세웠다. 1910년 일제가 식민 지배를 시작하고 눈에 거슬렸던 분진학당을 통진공립보통학교로 변경했다. 위압적인군인교장을 앉혔다. 지금의 월곶초등학교다. 일제는 국가의 근간이었던 사직단을 없애고 신사를 설치해 이 학교 학생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도록 강요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했다. 월곶면에는 당시 신사참배의 기억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
김포항일독립운동 불을 지피다
월곶면은 김포에서 가장 먼저 ‘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진 마을이다. 19년 3월 22일 이살눔, 성태영, 백일환, 박용희, 조남윤, 윤종근, 최복석, 이용린 등이 규합한 400여 명의 주민이 만세운동에 결합했다.
면사무소에서, 향교에서, 주재소에서, 시장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날 항쟁을 시작으로 양촌과 고촌으로 김포는 고을마다, 장터마다 만세운동의 행렬이 이어졌다. 백일환은 주재소 순사의 멱살을 잡아 무릎 꿇리고, 면사무소 서기들에게 국기를 쥐어주며 만세 삼창을외치게 했다. 이살눔은 45년 광복 후에도 매년 8월 15일이면 어김없이 맨발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들고 군하리 일대를 누비며 ‘그날의 함성’을 되살렸다고 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