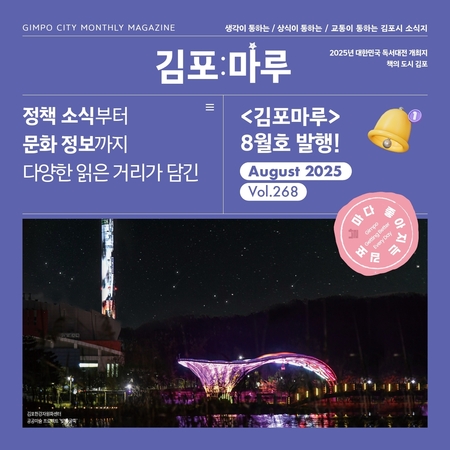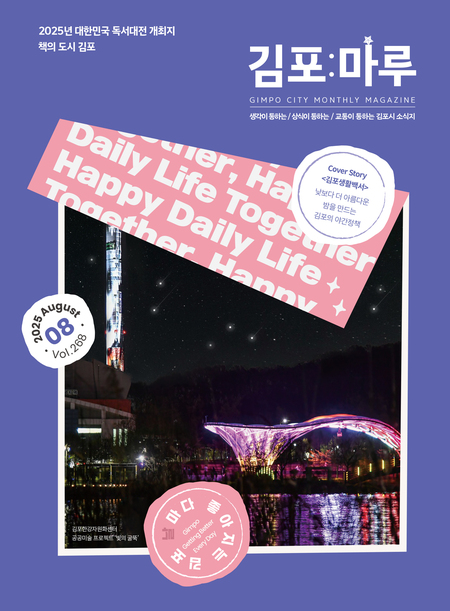|
수백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을 살찌웠을 토종 작물들이 사라졌다. 한 해만 살고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는 식물들이 먹거리 재료로 식탁에 오른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다시 딸에게 대대로 물려줬던 귀한 씨앗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식량의 상품화, 대량생산 농업, 돈 되는 밭과 작물을 선택한 결과 기업으로 넘어간 씨앗은 더 이상 농민들의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 농민들은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우리 땅에 맞지 않는 작물을 키우기 위해 수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고 토종 씨앗을 보급하자며 땀 흘리는 단체가 있다. 김포 토종학교는 알음알음 얻은 씨앗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배움을 나눈다. 장기동에 있는 학교에선 조금 고되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흔한 비닐 멀칭도 하지 않는다. 건강한 땅에서 잡초라 불리는 풀들과 얼기설기 어우러져 뿌리내리고 있는 토종 작물들을 만날 수 있다. 글 황인문 시민기자
토종으로 넘쳐날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토종 씨앗은 이 땅에 토착되어, 형질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종자를 말한다. 원산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라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땅과 기후에 적응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재해에 강해 자가 채종이 가능한 작물의 씨다. 올해 4월부터 경작을 시작한 김포 토종학교(김포대로1237번길 75)는 작은 텃밭이지만 수풀 사이사이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다양한 품종을 만날 수 있다. 청방배추, 무릉배추,구억배추, 경종배추 같은 배추류와 쥐이빨옥수수,울릉도고무신, 남작감자, 너브네상추, 개샛바닥,조갈, 비나리 등은 생소하지만 정감있는 이름을 가졌다. 김도경(57) 토종학교 교장은 참외와 비슷한 울외를 사랑스런 눈빛으로 내어보였다. 김 교장은 “토종 작물은 질기고 뻣뻣하지만 섬유소가 많고 건강해지는 맛이다. 땅에 적응한 씨앗들은 병해충에 강하고 보존이 오래 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빼앗긴 들에 토종이 넘쳐날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만발만 텃밭을 일군다.
못나도 우리 씨앗, 우리 미래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씨앗의 원 주인은 이 땅의 농부였다. 작물의 가치보다 상품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풍토 속에 주인은 어느 순간 종자를 잊어버렸다. 그나마 토종의 명맥을 잇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작물은 ‘콩’이다. 회원 김현정(52) 씨가 주섬주섬 여러 콩을 꺼내 보였다. 어금니동부, 야곱의 콩,푸른밤콩, 키작은 강낭콩, 강화푸른콩, 불콩, 투탄카멘 완두콩, 자주꽃 완두 등이다. 콩 종류가 이렇게 많았다니. 김 씨에게 토종 농사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화학비료에 죽어가는 땅과 한 해 농사밖에 짓지 못하는 변이 개량종 씨앗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섰다. 김씨는 열매가 작아도, 소출이 적어도, 예쁘지 않아도 토종 씨앗에서 자란 배추와 무, 토란은 마트에서 사는 그것과는 맛과 느낌이 다르다 했다.
‘토종’의 다른 이름 ‘그리움’ 9월 첫 주말, 토종학교 회원 10여 명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짓고 깨를 볶고, 콩을삶았다. 잎밥과 콩국수를 해먹겠다며 분주하게 몸을 놀린다. 연잎과 함께 토종토란잎, 열매마잎 등을 펼쳐 가마솥에 지은 밥과 콩, 밤, 연근, 표고,단호박, 견과류를 한데 모으고 마지막 금화규 꽃을 얹어 예쁘게 싸맸다. 장단콩으로 만든 콩국수와 구억배추로 담은 묵은지, 쇠뿔가지 장아찌, 노각 무침 따위로 근사한 한 상이 차려졌다. 회원 김숙경(59) 씨에게 토종은 ‘그리움’이다. 할머니가 키우던흰당근 씨앗을 구하다 토종 모임을 알게 됐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그리움을 하나 둘 새롭게 찾아가는 재미가 크다 했다. 토종학교는 매달 한두 차례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 말까지 가지과 열매 채종, 깍두기 등 김장, 두부 만들기, 청국장 담그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운영기관 김포 토종학교 센터 010-4675-5679
이 기사 좋아요 3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시민이 만드는 김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