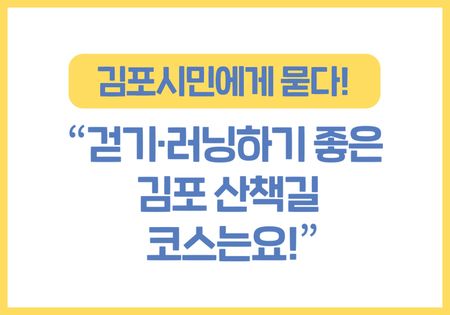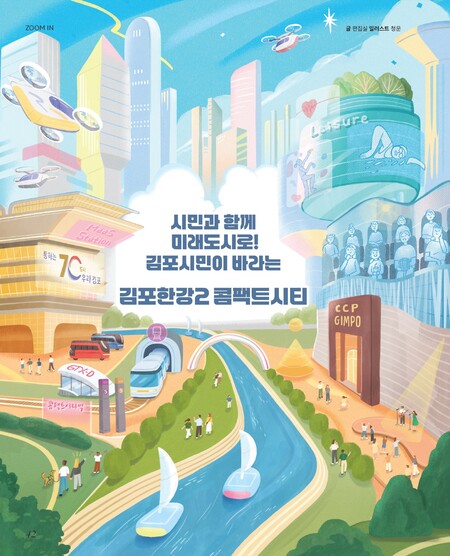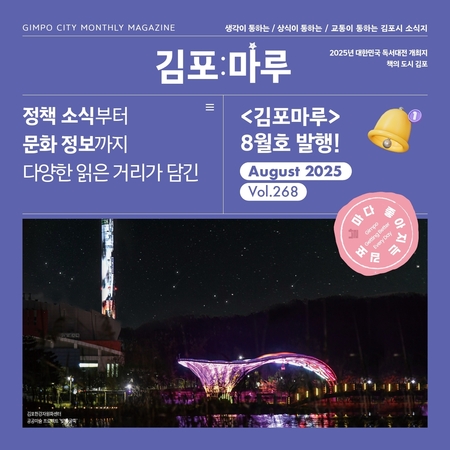서해 바다와 한강에 둘러싸인 김포는 예부터 땅길보다 물길이 발달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실거렸다. 철책에 가려지지 않았다면 육상교통보다 효율적인 해상교통이 지금 김포의 주된 교통 수단이 되었을지 모른다. 한강에서 서해까지 물길 끝마다 포구와 나루가 즐비했다. 고촌 섶골나루부터 대곶 대명나루(대명항)까지 역사적으로 알려진 포구와 나루가 11개에 이른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나루가 해안선을 따라 빼곡하게 자리했었다. 나루마다 시장이 형성됐고, 사람들이 모였으니 많은 이야기와 문화가 쌓였다. 어찌 보면 김포의 나루는 과거 유산이라기보다는 미래 자원이다. 철책이 사라지고 더욱 풍성해질 김포의 미래를 기대하며 나루 이야기를 꺼내본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나루터였던 ‘섶골’을 만나보자. 글 황인문 시민기자 도움말 류지만ㆍ윤순영 전 문화원장. 도움글 김포군지(1993), 김포군지명유래집(1995), 역사문화 학술대회 발제집(김포문화재단 2016)
한강, 인천, 고양시 잇는 터미널 나루터 섶골나루는 고촌읍 풍곡리 1번지(금포로 549번길 227)에서 한강변 쪽 지점 일원에 있었다. 한강변 철책선 안쪽에 있으며, 군초소가 있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아쉽게도 기록으로만 만날수 있다. 과거 섶골나루는 한강하류에서 마포나루로 가는 중간 연결지점의 역할을 하였고 주막이 5개 정도 있었다. 여객선이 정박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고양 신평리와 연결되는 뱃길로도 기능하였고, 우시장으로 유명했던 인천 계양 황어장을 오가는 상인들도이용했다. 황어장을 갔던 상인들이 다음날 고양장을 가기 위해 섶골나루에 하룻밤 묵는 날이면 밤새 온 동네가 소 울음소리로 잠을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서울과 인천, 고양시를 연결하는터미널이었던 셈이다.
장작불로 왜선을 불사른 주민들 ‘장작’, ‘땔나무’의 뜻을 가진 ‘섶’자가 붙어 ‘섶골’이라는 마을 이름을 가졌다. 임진왜란 당시 이 마을 산 아래 왜선(倭船)이 강을 지날 무렵 주민들이 장작에 불을 붙여 던져 불살랐다는 데서 유래됐다. 한자로 ‘신동(薪洞)’이다. 섶골마을 주민들의 기습적인 불벼락을 맞은 왜군들은 혼비백산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행주산성에서 패퇴했다. 주민들의 의기는 근대까지 이어졌다. 1919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3월 23일, 24일 이틀간 마을의 뒷산인 당살미에 모여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섶골마을은 ‘소애’란 이름도 가졌는데 ‘나무 우거진 언덕’이라는 뜻이다. 소애, 신동, 섶골 모두 나무와 뜻이 깊다. 한강제방을 막기 전에는 한강물이 이 마을까지 올라와 배를 대곤 했다고 해서 배대이(渡船場)라고도 불렸다. 헌종 8년(1842) <김포군읍지> 형승(形勝)편은 “신동의 옛 이름은 소애로 동북 강변에 있는데 강산, 수풀, 골의 경치가절경이다(薪洞古名踈涯在東北間江邊有江山林壑之勝)”고 했다.
돌방구지 물범, 빙고, 참외 서리 섶골 동편의 강가 언덕에는 돌이 많이 쌓인 곳이 있는데, 바로 ‘돌방구지’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잔점박이 물범이 숨을 쉬러 올라오곤 했다. 주민들은 물범의 생김새를 보고 ‘물돼지’라 불렀고, 숨쉬는 소리를 따라 ‘쒸익지’라고도 했다. 기록에 의하면 섶골나루는 1910년 이전에 폐지됐지만, 마을 주민들은 철책이 둘러쳐지기 전까지 인근에서 고기를 잡고 물놀이를 즐겼다. 숭어, 모래무지, 웅어, 황복, 민물장어 따위를 건져 올렸다. 6~7월에는 한강에서 실뱀장어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6.25 전까지 똑딱선으로 고기잡이를 하기도 했다. 옛날 고양시는 참외 밭이 많았는데,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아이들이 헤엄쳐 건너가 참외를 서리해 먹기도 했다. 1940~1950년대에는 홍수가 나면 마을이 물에 잠기기 일쑤였는데, 마당에서 낚시를 했을 정도였다. 얼음 창고라고 불리던 빙고의 흔적이 남아있고, 섶골나루 주변으로 새우젓독을 만드 는 가마터도 있었다고 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