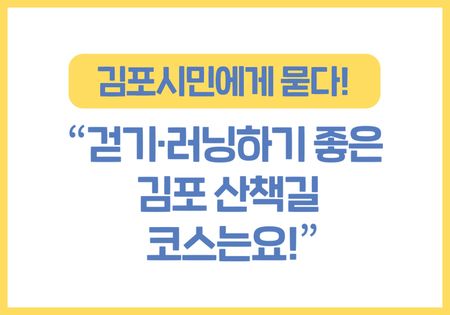20여 년간 김포에서 경기민요를 부른 민간단체가 있다. 사단법인 경기민요합창단이다. 합창단은 경기민요를 통해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고 넘치는 흥을 시민들과 나누었다. 오랜 세월 단체를 유지한 비결을 윤소리(72) 단장에게 물었다. 글 이청 시민기자
더불어 만든 시간 지난 10월 30일 (사)경기민요합창단이 통진두레문화회관에서 ‘평화의 강, 한강 아리랑’을 주제로 20주년 기념 공연을 펼쳤다. 약 2시간 동안 선보인 이번 공연은 선유가로 시작해 태평가, 아리랑, 밀양아리랑, 흥타령 등으로 이어졌다. 경기민요 가락에 내빈과 1백여 명의 관객은 연신 어깨를 들썩였다. ‘김포 금쌀 타령’과 ‘내 사랑 김포’를 끝으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합창단의 열정을 향한 관객들의 감사와 응원의 박수였다. 개인 단체가 10년을 넘기는 일은 흔치 않은데 무려 20년이다. 긴 세월 동안 경기민요합창단은 경기 민요를 통해 시민들과 흥을 나누었다. 매년 1회의 정기공연은 물론 경로당,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진행한 재능나눔 봉사 등 그간 올린 크고 작은 공연을 합치면 2천회가 넘는다. 비결이 뭘까. 경기민요합창단을 이끄는 윤소리 단장은 당연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 덕분이죠. 선생과 제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율성이 피어났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스스로 연습하는 단원들이 있어 20주년 공연이 가능했다고 윤 단장은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녀를 움직이게 한 힘은 김포에서만 400년 넘게 거주한 남원윤씨 자손으로서의 사명감과 단원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조상에게 또 단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윤 단장은 최선을 다했다. “아이 다 키워놓고 상실감을 느끼던 사람이 우리합창단에 들어와서 민요를 부르며 밝아지고 또 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며 자신감을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쉴 수 있나요.” 민요를 통해 더불어 산다는 것. 이것이 경기민요합창단이 오늘날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다.
내일을 위한 노래 우리 음악의 매력은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시작으로 국악과 힙합을 결합한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트로트 열풍 역시 맥을 같이 한다. 흐름에 발맞춰 교육 현장에서도 민요를 찾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교육 요청이 늘어 윤소리 단장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아직 목이 마르다. “고 박동진 명창의 말씀이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민요를 가르쳐야 한다는 게 윤 단장의 주장이다. “민요는 옛것이고 오늘 배우기엔 어려운 노래라고 막연히 멀리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하면 되나요. 거기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음악에 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녀는 슬며시 웃음을 지었다. 정말이다. 살다 보면 어느새 “짜증은 내어서 무엇허랴” 흥얼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우울한 날에는 맑고 경쾌한 경기 민요가 더욱 반갑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의 종식도 머지않은 듯 보인다. 경기 민요 한자락으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다시 찾을 일상을 기다려 보면 어떨까. 얼씨구나 좋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