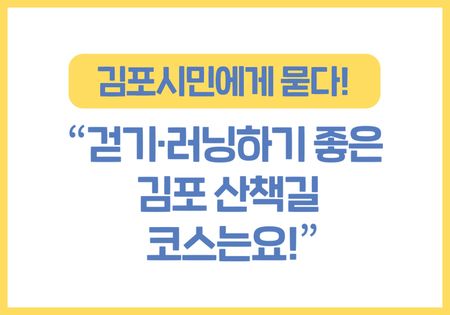|
아이들은 자란다 덕포진 교육박물관 글 이청 시민기자
34개월에 접어든 아이는 요새 역할극에 푹 빠졌다. 상상 속에서 장난감 자동차는 말을 하고, 붕붕카는 우주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이란 말이지?” 오래된 회전무대에 아이가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덕포진 교육박물관에 왔지만 어째 주차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시작된 역할극 때문이다. 어른들 눈에는 평범한 자갈밭도 아이 눈에는 놀이터로 보이나 보다. 돌멩이를 줍더니 이건 눈사람이고 성으로 가야 한단다. 엄마 아빠는 극이 끝날 때까지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하늘이 참 맑은 가을날이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책 읽는 소녀 동상 주위로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이따금 새가 지저귀었다. “엄마아아.” 잘 놀던 아이가 울먹이며 달려왔다.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서인 듯했다. 덕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상상놀이가 마무리되고 우리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덕포진 교육박물관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부부가 1996년에 설립한 사립박물관이다. 과거 학교에서쓰던 물건들은 물론 먼 옛날의 전통문화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60년대 교실을 재현해 놓은 전시실에서 아빠는 신이 났다. 나무 책걸상이며 교실 한가운데에 놓인 난로며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랑 똑같단다. 하지만 아이의 기분은 달랐다.
“엄마, 나 돌멩이랑 노는 게 더 좋아.” 다시 주차장으로 가겠다는 고집에 난처하던 때 누 군가 등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우리 아이, 노래 좋아해요? 같이 노래 부를까? 뒤에 앉아봐요.” 회전무대에서 뵈었던 할머니, 알고 보니 박물관 관장님이었다. 그렇다면 입구에서 우릴 맞아주셨던 할아버지도 그 부부 관장님?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의자에 앉는 사이 할머니 관장님께서 교실 앞 풍금에 앉았다.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정겨운 풍금과 노랫소리가 옛 교실에울려 퍼졌다. 잔뜩 긴장했던 아이는 어느새 으쓱으쓱 율동까지 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기분이 조금 풀린듯하니 더 둘러볼 수 있겠다. “나갈래요. 으앙.” 이런. 박물관 특유의 어두운 조명이 문제였다. 상상력이 커진 탓인지 요즘 들어 부쩍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꼬맹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가기엔 여기까지 오느라 들인 노력이 아깝지 않은가. “이것 봐봐. 아코디언이네. 그림책에서 봤지? 하프도 있네.” “2층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여기 모여라, 추억의 놀이 속으로> 전시? 우와, 아빠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말이네. 옷 갈아입히기 종이 인형봐. 너무 예쁘다.” 엄마 아빠가 목소리 톤을 올리며 신명나게 관심을 끌고 나서야 아이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기세로 3층까지 가는 거야! 산업화 이전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맛보자.
“으아아아아아앙!” 망했다. 옛 물건이 만들어내는 무거운 공기, 그리고 한층 더 어두운 조명이 아이의 공포심을 끝내 터뜨리고 말았다. 여기까지 오면 별 수 없다. 장렬히 후퇴하는 수밖에. 일단 울음을 멎게 하는 게 급선무다. 뭐 좋은 게 없을까 두리번거리던 차, 나무로만든 소 모형이 눈에 들어왔다. “음머어어. 아가야, 왜 울고 있니.” 엄마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소가 말을 하는 척 꾸몄다. 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를 바라봤다. “소야, 나아 박물관에 갇혔어. 나갈 수가 없어.” “그렇구나. 아가야. 귀를 기울여봐. 풍금소리를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응. 알아쒀.” 아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린다.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다시 엄마로 돌아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다. 아빠는 아쉬운지 연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이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음머어. 아가야. 이 다음에 또 만나. 캄캄한 어둠을 이겨내고 나를 보러 와.”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