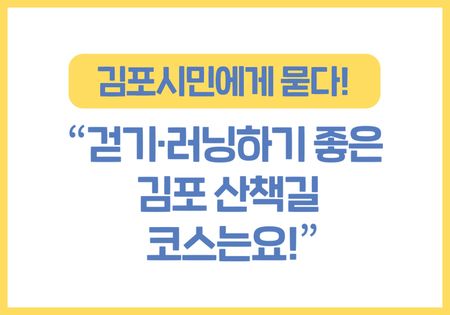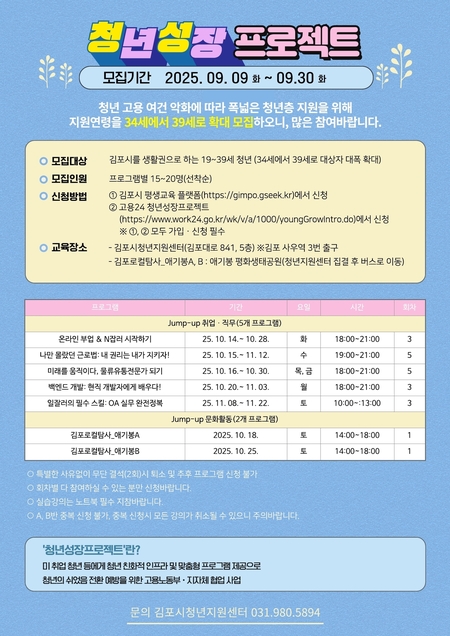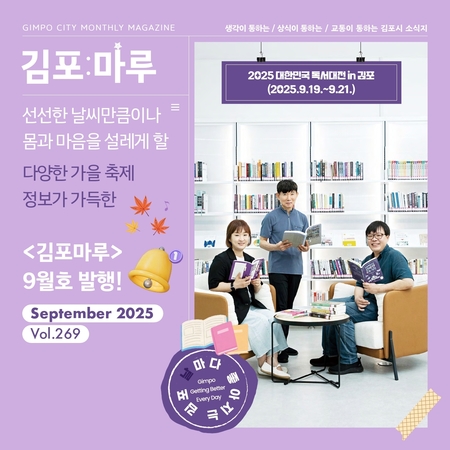바빠진 농촌, 어김없이 찾아오는 더위 더위가 시작되면 농사일도 바빠진다. 벼가 무성히 자랄 무렵 피도 함께 자란다. 피를 뽑아내는 일을 피사리라 하는데, 논농사에서 가장 귀찮은 일이다. 삐쭉삐쭉 튀어나온 피는 당해 벼 소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논에 떨어지면 다음해까지 애를 먹기때문에 미리 미리 뽑아내야 한다. 번거롭고 고된 작업이지만 한 해농사의 흥망을 좌우하는 작업이다. 삼복이 들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농상기패가 풍물을 치고 마을을 돌며 권농과 풍농을 기원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김포 곳곳 마을마다 농상기패가 있었다. 농상기패의 장단과 복날 음식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더위를 이기는 힘이 됐다.
더위를 이긴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 개똥이네가 초복날 닭을 잡으면, 중복에는 순분이네가, 말복에는 간난이네가 닭을 잡았다. ‘누구네 닭이 맛있네’라는 소리를 듣기위해 정성을 쏟았다. 여럿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닭을 잘게 뜯어 찹쌀밥을 넣고 죽을 끓였다. 엄나무, 두릅나무를 넣고 닭을 삶아낸 후 뼈와 살을 분리했다. 뼈는 다시 육수가 우러나오도록 오랜시간 끓였다. 고기는 마늘과 파, 깨소금으로 양념해 버무렸다. 흔한 복날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금의 삼계탕이나 백숙과는 달랐다. 인삼이나 대추도 넣지 않고 담백하게 우려냈다.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웃까지 보살피는 마음은 넉넉했다. 장마철 눅지근해진 몸에 기력을 불어넣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엔 익모초 즙을 내서 한 사발씩 마셨다. 맛이 쓰고 차가운 익모초는 더위를 이기고 식욕을 찾아줬다.
강가에서, 수로에서 ‘여름사냥’ 강 어귀 천변에서 잡은 잉어, 장어, 붕어 따위 물고기도 보신을 위한 식재료였다. 물고기는 낚시나 게매기(게막이)를 통해 수확했다. 게매기는 수로에 물이 빠졌을 때 그물을 쳐놓았다가 물이 들어올때 건져 올려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잉어는 배를 갈라서 불린 찹쌀과 인삼을 넣고 문드러지지 않도록 삼베자루에 싸맨 후, 당귀와 엄나무 삶은 물에 푹 고아냈다. 제방쪽 갈대밭 사이에선 뜰망으로 민물고기를 건졌는데, 메기, 빠가사리, 숭어, 농어 등이 제법 올라왔다. 당시에도 장어는 여름 보신음식으로 제격이었다. 겨울에 말려뒀던 귤껍질과 연밥(연자씨), 호두, 잣, 생강, 당귀 등을 넣어 삶았다. 머리와 뼈에서 우러난 진한 국물에 밥이나 국수를 넣어 말아먹었다.
장독이 비어도, 작물이 사라져도… ‘복날’이니까 수로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는 붕어였다. 수문을 열어놓으면 물을 거슬러 오르는 놈들을 손으로 더듬어 잡을 정도였다. 주로 동네 청년들이 모여 붕어를 잡아 매운탕을 끓였는데, 뚝방과 계곡에서 즐기는 가난한 시절 피서법이었다. 양은솥만 준비되면 나머지 재료는 어디서든 구했다. 장맛이 좋기로 소문난 집 고추장 독은 유독 삼복시기에 동나기 일쑤였다. 깻잎과 파는 들판 어디에도 널렸다. 삼복 때 어른들은 자신의 장독이 비어도, 들판에 채소가 없어져도 슬쩍 눈감아줬다. ‘선한 신은 상 위에 들고, 악한 신은 상 밑에 있다’고 했다. 동네 이웃들은 작은 양이라도 감추지 않고 나눴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고, 음식은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배달된다. 그래도 다가오는 삼복, 바쁜 일 조금 늦추고 잊고 지냈던 고마운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나누며 정겨웠던 우리풍습을 되살려 봄이 어떨까.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