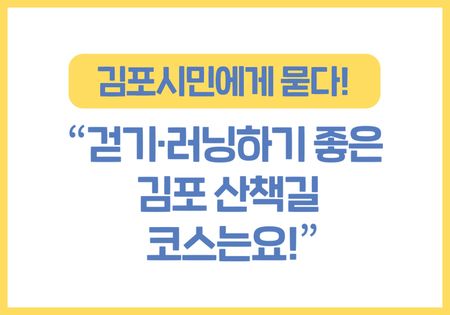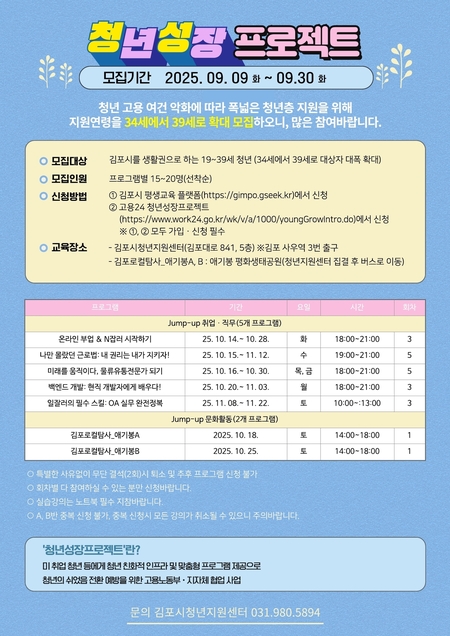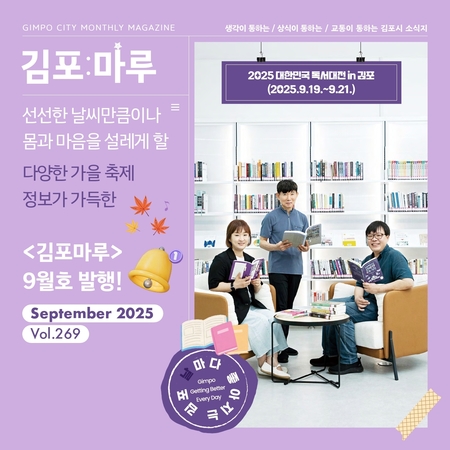|
가을, 노랗게 물든 들판은 마음 넉넉해지는 풍경이다. 드넓은 평야를 수놓은 황금빛은 그 자체로 김포를 상징한다. 홍도평을 지척에 둔 사우동에는 금파초등학교와 금파중학교가 있다. 학교 앞에 펼쳐진 금빛 물결을 따라 교명을 ‘금파(金波)’로 했다. 김포의 문화예술인들은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서 ‘금파문화제’를 펼쳤는데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진 행사였다. 비옥한 평야를 가진 김포에서 쌀은 숙명이었다. 추수를 앞둔 9월 ‘쌀 이야기’로 김포를 만나보자. 글 황인문 시민기자 도움글 김포군지(1993), 김포시사(2011), 비옥한 땅 김포미(농업기술센터 2019)
우리나라 최초의 벼농사지대 김포 1986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와 서암리 일대에서 한반도 벼농사의 개시를 밝혀 줄 획기적인 자료가 발견됐다. 지표아래 약 1~4m 토탄층에서 고대의 볍씨, 벼꽃가루, 조, 각종 씨앗 등이 출토된 것이다. 토탄(土炭)이란 이탄(泥炭)이라고도 하는데, 식물이 퇴적되어 수 천년 간 물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탄화된 것을 말한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출토된 볍씨와 화분(禾紛)의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5,000년 이전이라는 절대연대를 산출했다. 이로 보아 김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가 시작된 대표적인 평야지대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지역에선 벼, 조와 같은 탄화곡물류 외에도 곡물을 빻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반형 석기, 말각반형 석기 등 농사 도구도 함께 출토됐다. 김포 쌀의 역사는통진읍 마송리(마송1로 83번길 50) ‘토탄농경유물전시관’에서 만나보자. 2014년 개관한 이곳 전시관에선 벼농사의 시작과 토탄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김포지역의 전통적인 농기구 등 농경문화와 유물을 볼 수 있다.
임금상에 오른 김포 토종 자광미 조선시대 쌀은 민심의 원천이었다. 쌀농사가 잘못되면 민초들의 삶도 무너졌다. 쌀의 작황에 따라 민심이 동하니, 나랏님도 노심초사 벼농사 걱정이 많았다. 이런 나랏님 걱정을 덜어준 땅이 있었으니 바로 김포다. 조선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은 ‘북쪽으로 한강 하류에 임하여 토지가 평평하고 기름져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 이라고 김포를 소개했다. 김포에서 생산된 쌀은 예부터 최고의 미질과 맛으로 임금 상에 올랐다. 조선시대 김포의 대표적인 쌀은 자광미다. 쌀의 색깔이 엷은 자색(紫色)을 띤다 하여 이름 붙여진 자광미(紫光米)는 300년 전 당시의 통진현(현재 김포시 월곶면) ‘밀다리’ 밑에서심은 것으로부터 유래되어 ‘밀다리쌀’이라고도 불렸다. 자광미는 줄기가 많고 성장이 빠르다. 대가 가늘어서 많이 심으면 비바람에 쓰러지기 쉬워 재배하기 까다롭지만 밥맛이 끈기가 있고 구수한 향기로명성을 얻었다.
가을걷이 후 ‘추금’ 날아드는 들판 쌀 미(米) 자를 파자하면 팔(八)+십(十)+팔(八)자로 이뤄져 있다.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한 알의 쌀이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밥은 고된 노동의 소산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쌀 부족에 허덕였다. 오죽하면 생일날 흰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을까.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해 1964년 통일벼가 개발되고, 1970년대 말에 들어 비료와 동력을 이용한 탈곡기, 발동기 등 농기계의 보급으로 그나마 식량 걱정을 줄일 수 있었다. 김포평야의 드넓은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일손은 더욱 바빠졌다. 동네마다 열댓 명씩 모여 품앗이를 해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예전에는 서리가 내린 다음에야 벼베기를 시작했다. 나락이 제대로 여물고 볏짚도 잘 말라 있기 때문이다. 낫으로 벼를 벨 때는 보통 네 줌(뭇)을 한 단으로 묶는데, 한 단은 쌀이 한 되 가량 나오는 분량이 된다. 논바닥에 볏단을 세워 말릴 때는 20단을 ‘한 가리’ 또는 ‘한 광’이라고 하고, 이를 타작하면 쌀이 한 섬이 된다. 20단이 넘는 긴 가리를 ‘장광’이라 하고, 이때는 한 광마다 볏단을 거꾸로 세워 그 양을 표시한다. 이를 ‘줄가리친다’고 했다. 벼를 베면 바로 단으로 묶어서 논바닥이나 논둑에 세워보통 20여 일 간 말린 후 타작을 했다. 추수가 끝난 김포의 들판엔 큰 기러기가 새카맣게 날아들었다. 대충 돌을 던져도 맞을 정도로 하늘을 메웠다. 추석을 알고 찾아온다 해 ‘추금(秋禽)’이라고 불렀다. 추수가 끝난 논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벼이삭을 모아 불을 놓아 쌀을 튀 기고, 덜 여문 콩대를 얹어 구운 ‘콩튀기’로 허기진 배를 달랬다.
김포금쌀 구입 등 문의 김포시 농정과 031-5186-4283
이 기사 좋아요 3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