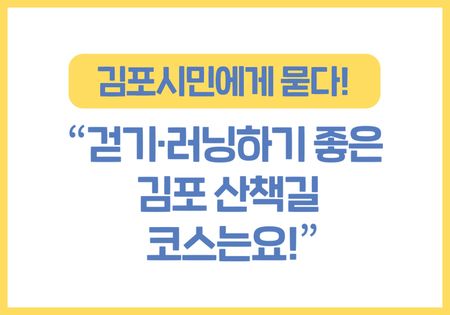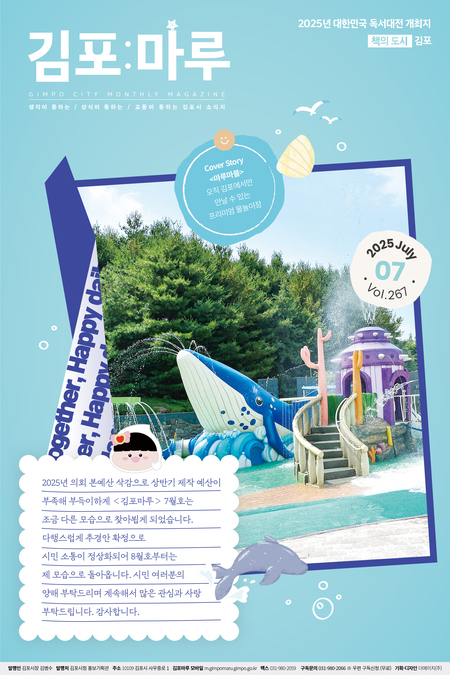|
잘 익은 벼는 이앙기를 이용해 1차 탈곡을 거친 다음, 정미소에서 도정 과정을 거칩니다. 벼가 쌀로 변신하는 과정이죠. 도정을 거친 쌀은 포대에 담아져 각지역으로 운송돼 여러 가정의 식탁의 품격을 높여주죠.
요즘에는 도정된 쌀을 비닐이나, 종이 포대에 담아 판매소로 이동하는데 예전에는 가마니를 사용했죠.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만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가마니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는 데요. 가마니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마니는 짚으로 꼬아 만든 줄, 즉 새끼로 짜서 만든, 요즘 말하자면 포장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사용 용도에 따라 비료가마, 볏가마, 쌀가마로 나뉘어 사용되었습니다. 또 날 수도 각기 달라 비료가마는 좀 느슨한 17날, 볏가마는 20날, 쌀가마는 22날로 짰는데, 날 수가 많을수록 더 촘촘하고 든든한 가마로 인정받았죠.
농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흔히 볼 수 있던 가마니는 우리 김포지역 여러곳에서도 생산되었는데요, 대곶면 신안리 일대에는 포장용 가마니를 생산해 외지로 보내 소금 등과 같은 물자로 물물교환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 탄탄하게 짠 ‘고경’을 비롯해 고경보다 조금 느슨한 ‘쌀가마’, 그리고 아주 느슨한 ‘소금가마’ 등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 가마니를 묶는 새끼줄도 무시로, 왕올기, 간새끼 등으로 구분했는데요, 무시로는 아주 단단해 나무나 쇠 등을 묶었고, 왕올기는 굵은 새끼줄로 쌀가마 등을 묶었다고 합니다. 가는 간새끼는 생선이나, 달걀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묶었죠(김기송 전 김포문화원장 증언).
그런데 가마니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마니는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들어왔죠. ‘가마니’라는 이름도 일본말 ‘가마스(かます)’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가마니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섬을 썼다고 하는데요. 을 썼으나, 섬은 날 사이가 성기어서 낱알이 작거나 도정된 곡물은 담지 못하고 오직 벼 · 보리 · 콩 등만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섬은 가마니에 비해 담을 수 있는 양은 많으나, 그만큼 무거워서 한 사람이 들어 옮기기도 어려웠죠. 그에 비하여 가마니는 한 사람이 나르기에 적당하고 높이 쌓기에 편리하며 날과 날 사이가 잘 다져져서 어떤 곡물도 담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빈 가마니는 차곡차곡 재어놓기도 좋으며, 더욱이 반으로 접을 수 있어 보관에도 편리 했다고 하네요. 조금씩 사라지고, 잊히는 우리의 옛 물건들. 그중 가을이면 생각나는 물건은 바로 가마니입니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마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시민이 만드는 김포 많이 본 기사
|